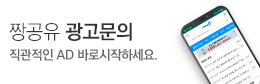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파안의 그녀.30

“시끄러워!!”
나는 어벙한 그의 얼굴에다 힘껏 소리 질렀다.
숨이 가쁘다.
짜증이 하도 나서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는 내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는지, 황당한 표정이었다.
그러더니 나에게 말했다.
“왜 그래? 대체?”
“시끄러워!! 시끄러워!! 짜증나!!”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나 짜증나는데.
나쁜 놈.
소리가 저절로 커졌다.
그러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의 얼굴이 코앞이었다.
그는 조금 뒷걸음질 친 것 같았지만 내가 빨랐다.
“예...예리야?”
“시끄러워..”
막상 코앞에 다가갔으나.
바보같이 오히려 음성이 작아졌다.
나는 왠지 고개를 숙여버렸다.
또 정면에서 바라보면, 아까의 일이 떠올라
화가 치솟을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뭔지 모르지만, 예리야?”
하지만 그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바보같이, 나를 바보같이,
언제나 약해지게 만드는 음성으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화를 내던 걸 순간 잊고는, 고개를 들고 대답해 버렸다.
“응?”
“대체 여긴 어디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엉뚱한 대사였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걸 전혀 몰라주고.
상황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건지, 기가 막혔다.
이젠 나한텐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건가?
이렇게 짜증나는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뭐라고? 이 나.쁜.놈.아.!”
결국 나는 나를 자제하지 못하곤, 치솟는 열에 그만 그를 발로 차버렸다.
그의 배 부분이 나의 발에 정확히 가격당해서는, 그는 그만 뒤로 나자빠져 버렸다.
“아악!”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기억난 것은, 이미 차버리고 나서였다.
그만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버렸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렸다.
비명까지 지르는걸 보니, 많이 아파 보였다.
곧 자빠진 상태로 상체를 일으키더니,
“콜록콜록”
빨간 선혈을 입에서 토해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피는, 곧 땅바닥을 적셨다.
나는 하얗게 된 머릿속을 열심히 해엄 쳤다.
피다.
인간의 피는 좋다.
더러운 피를 흩뿌리며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이건 다르다.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빨간색.
바로 그의 피라고 생각했다.
그의 피를 본 날들은, 언제나 슬펐다.
너무 너무나 슬퍼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피를.
그가 토해내었다.
또다시 나 때문에.
나는 무서워서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배를 어루만지며 물었다.
“괘..괜찮아?...”
조심스레 그의 얼굴을 보았다.
계속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웃지 않는다.
괜찮다고 웃지 않았다.
“안 괜찮아,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다짜고짜 소리는 지르지 않나,
발로 차질 않나.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오랜만에.
아니 거의 처음 들어보는, 냉담한 말투에.
나는 바보같이 몸이 떨렸다.
화가 난건가?
하지만.
갑자기 “Z”의 그년이랑 이야기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니?
그런 건 당연하잖아.
아까 일을 생각하니 다시 기분이 나빠져서,
또 소리를 질러버렸다.
“일어나자마자, Z의 미친년이랑 사이좋게 이야기 하고!! 짜증났단 말이야!!”
뭐가 불만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아예 말해주었다.
나쁜놈.
“뭐? 별로 사이가 좋지도 않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아무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냐고 되묻는다.
내가 왜 화났는지.
왜 모르는 걸까.
“그건...”
나는 약간 망설였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넘어가야지.
결국 나는 거의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손..까지 잡고 있었잖아..”
나는 간신히 말을 꺼내고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원래의 그의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약간 웃음을 억지로 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사람의 표정은, 읽기 쉽다.
옛날부터 그랬다.
연구소 사람들의 더러운 표정을.
그나저나, 그는 뭐가 웃긴 거지.
“예리야, 너 지금 질투 하는 거야?”
“어린애 같기는”
그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질투라니?
질투라는 건 뭘 말하는 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니.
모른다. 그런 건.
“질투?”
“그..그게 뭔데!!”
나는 궁금해서 되물었으나.
그는 오히려 더 웃는 표정이 되었다.
얄미웠다.
“됐어 바보야”
대답은 해주지 않고, 바보라는 소리를 하더니.
손을 올려 내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예리야. 아까 그건 오해라니까? 정말 링거를 갈아 주다가, 불가항력으로 손이 잡힌 거
뿐이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으니까. 후후“
기분 좋았다.
그의 손길이.
그치만.
오늘은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없다.
정말루 화났으니까.
그년이랑 그렇게 친했던걸, 이런 식으로 때우려고 하는 건.
저번에도 그랬다. 병원에서도.
“흥... 전에 병원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
그..그렇게 웃으면서!!!”
나는 쌓인게 많았다.
내 기분을 나쁘게 한 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
절대루.
쉽게 넘어갈 수 없다.
잠깐 떨어져 있던 사이에.
젤 싫어하는 여자랑.
아는 사이가 돼서는.
아무리 봐도 친해 보였다.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나한테 말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 하고.
그런 건 싫었다.
그년이 아니더라도.
그가 다른 인간하고 친한 게 싫었다.
무섭다.
전부다 죽여 버리고 싶어.
“싫단 말이야”
“싫어”
왠지 우울해 졌다.
너는 나한테만, 웃어주면 되는 거다.
눈이 아팠다.
눈에 물이 맺히는 느낌이 들었다.
“죽이게 해줘. 그년을 죽이게 해주면, 넘어갈 테니까.”
내 말에, 그는 고개를 저어 보이더니.
몸을 움직여서 나를 감싸 안았다.
“바보야. 죽이면 안 된다니까!. 어찌됐든 나를 구해준건 그 사람이야.
잊었어?“
그 말에 나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 내가, 그년에게 가장 화났던 건.
무력한 나 때문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인간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살릴 수는 없는 걸.
“아무튼, 그녀와는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제발 화 좀 풀어.
우리 예리가 최고지? 안 그래?“
“............”
그는 또 그렇게 어물쩡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그의 품안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그 따뜻함에 취해 결국 더 이상 딴말을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대답해 버렸다.
“응...”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도 분명히 인간인데.
왜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데도, 죽일 수 없고, 그리고..
“대답했다?”
그는 나를 살짝 때어내곤,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그렇게 한참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울컥하는 것과는 달랐다.
막 가슴이 진정이 안 되는, 열이 올라오는 느낌.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상하다.
이런건 처음이다.
대체 왜이러는 거지.
“그런데 예리야?”
내 상태가 이상한걸, 그는 아는지 모르는지.
나를 불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여긴 어디야? 대체?”
-------------------------------------------------------------------------------------
ㅎㅎ
즐독입니다.
여전히 뭔가 좀 이상한것도 같지만.. 글두..
그냥 봐주시길^^
이제 슬슬 다시 이야기를 급격히(?) 진행시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