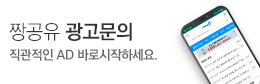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박찬욱 신작 "헤어질 결심" 기자 평점
댓글
38조회
21,720추천
30


탕웨이 보러 갑니다

 멋쟁이꿈나무의 최근 게시물
멋쟁이꿈나무의 최근 게시물
-
[44]범죄도시4 400만 돌파
-
[23]범죄도시4 평론가 평점
-
[14]에이리언 로물루스 예고편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