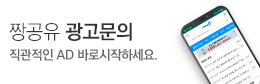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부산행 - 정서, 그만큼의 차이

이제, 개봉도 했고 어느 정도 시일도 지났으니,
부산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못보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스포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짧은 도움말에서 외국 좀비물을 상상하고 가시면 제대로 감상 못하실 거라고 썼는데, 그 말을 조금만 바꾸면 외국 좀비물에 ‘경도되어 있으면’ 제대로 감상 못하실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라고 제가 짧은 도움말에서 했던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외국 좀비물의 드라마 밑에 깔린 정서든, 외국 좀비물의 특수효과와 고어적인 면들이든, 그런 것들로 좀비물을 규정짓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날라 치면 재미없다는 반응은, 역시 이 부산행에서도 드러나는 분위기가 있더군요. 꼭 하늘에서 보는 대규모 몹씬을 도배해야 하고, 대규모 군대와 화력전 씬도 나와야 하고, 군대가 썰려야 하고, 좀 잔인한 장면이 꼭 나와줘야 하고, 뭐 그런 일종의 클리셰가 당연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쳐주고.
하지만 외국의 어떤 좀비물도 사실,
그 두 할머니와 관련해 차문을 여는 씬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끽해 빗댈만한 구조가 있다면, 좀비오의 마지막 장면과, 워킹데드에서 어린아이가 끝내 좀비가 되는 에피소드 정도? 그나마도, 이 씬에 비하면, 그 관계망과 정서가, 단순한 수준이라고 밖엔 평할 수 없는 정도.
외국의 좀비물은 오로지 ‘나’가 중심입니다. 어떤 인물이든 ‘내’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 좀비는 저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런 분석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고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걸 바탕으로 감정을 실을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좀비물의 시조쯤으로 언급되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냉전시대에 나왔다는 사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그런 인식의 선상에선 내가 가까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린치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니덜도 죽어봐라, 라는 감정 분석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작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역시 연상호 감독의 공력을 확 느꼈습니다.
돼지왕을 영화관에서 혼자서 (말 그대로, 상영관 안에, 저 혼자였음! ㄷㄷㄷ) 보면서 놀랬던 감흥들도 이 리뷰겟에 써본 적이 있지만, 연상호 감독의 특기는 사회비판적이니 뭐니 하는 그런 수사적인 간판에 갇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의 특기는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을 만들면서 시대배경을 찾아가고 끼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 즉, 인물과 상황을 따라가다 보니 사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형식이면서도, 그것을 봉준호 감독과는 전혀 다른 방식,
즉 우리의 일상, 밑바닥의 상황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겪는 말도 안되는 트러블, 폭언, 갈등, 갖가지 폭압적인 에피소드들에 사실 우리는 망각의 기술로 대처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지 자체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왜냐, 그걸 깊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그런데 연상호 감독은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냄으로서, 결과적으로 사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도 사회상이 표현되는 공력까지 올라갑니다. 그도 우리도 몸담고 있는 바로 이 사회의 날것 같은 부분. 문화가, 경제가, 사회인식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잘 참아내고 있다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들.
즉,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낯설게 보이게 하기’ 수준까지,
정서의 풀이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연상호 감독의 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행의 이야기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밑에 있는 정서들을 건드려가면서 나아갑니다. 때문에 등장인물이 처한 구조나 상황이 외국 좀비물의 그것과 같다고 틀을 씌우고 보는 순간부터 감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막판에 신파라고 혹평하는 감상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혹독한 세상에서 결국 물렸으니까, 그래서 죽어야 하는 ‘이분법적이지만 합리적일 수밖에’ 장면인데, 그걸 뭐 길게 늘리고 쌩난리를 쳐. 한국영화는 이래서 안돼. 그냥 신파네. 이렇게 인식하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서를 보면, 결국 그 장면까지 오기 위해서 그 캐릭터가 직장생활에 치이고 이혼에 치이는 과정들과, 그 속에서도 결국 방향이 아이를 살아남게 하겠다는 구조로 좁혀지고 아이에게 비난당하면서 자신이 절대 구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을 구하려 애써서 아이에게 인정받는 부모이기를 원하고, 그 좀비들을 뚫고 앞까지 오는 과정들의 결심과 감정선을 보면서,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부분을,
미리 틀을 씌워버린 인식이 훌떡 간과해서 보게 되어 버리는 거죠.
마치, 죠지 레이코프 교수의 프레임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 연상호 감독의 특징이 흐릿해졌다니 뭐니 하는 평들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사실 극중 캐릭터들의 조율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이라는 판단선상과, 위에서 설명드린 인식구조 선상에서 나올수 있을 법한 말이라고 생각될 뿐이죠.
뭐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만한 소동인 메탈리카의 로드 리로드 더블앨범 때 대중들의 오류 만빵적인 반응과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 개인적으로도, 좀 더 다른 스토리의 색깔을 내보고 싶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구요.
스크린을 너무 점유하고 있는 모습들은 좀 그렇지만,
작품 자체는 감독 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나왔고,
좀비물이란 장르에 빗대보아도 색다른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으로,
1. 전에 올려드렸던 1969년작 애니메이션 홍길동 상영회에서 대담자로 참여한 연상호 감독의 말들을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연상호 감독이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른 감독들의 작품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많이 기대되네요.
2. 진짜 신파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준익 감독의 '님은 먼곳에'를 추천합니다. -_-
 NEOKIDS의 최근 게시물
NEOKIDS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