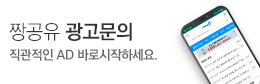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잠수함 사업 추진 20년


지난 3월 말 경남 진해 해군기지. 해군 주력 잠수함인 209급(1200t) ‘최무선함’의 고래등처럼 생긴 갑판 위 동그란 해치를 통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통로 양쪽 벽에 3층으로 설치된 접이식 벽침대는 몸을 조금만 뒤척여도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좁았다. 옆에 마련된 함장실은 0.5평이 채 안 돼 보였다. 별도의 식당도 없는 이 비좁은 곳에서 승무원들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올해로 해군이 잠수함사업을 추진한 지 20년이 흘렀다. 1987년 독일제 209급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하고 승무원 44명을 비밀리에 뽑아 독일 해군에 교육을 보낸 것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 ‘잠수함 강국’을 꿈꾸며 걸음마를 뗀 해군은 이제 잠수함 9척을 보유하고 있다. 핵잠수함을 빼면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214급(손원일함·1800t)까지 진수했다.
하지만 잠수함 생활은 고달픔의 연속이다. 좁아 터진 곳에서 40명 가까운 남자들이 짧게는 10여일, 길게는 두 달 이상 물속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와이에서 열린 다국적 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80일간의 항해에 나선 이모 중사는 ‘아들아 잘 있느냐. 나는 잘 있다’는 단 두 줄짜리 전문(電文)으로된 부모님 편지를 받았다. 해군기지에서 편지내용을 두 줄로 요약해 보낸 것이었다. 훈련 도중 물 위로 떠올랐을 때에야 개인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부친 편지인지도 알 수 없다.
잠수함 경력 20년의 한 대령은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수면위로 떠오를 때 받는 전문이 잠수함에서 들을 수 있는 육지 이야기의 전부”라고 말했다. 신혼 땐 항해를 다녀오면 부인이 “도대체 살아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바가지를 긁을 정도라고 한다.
오랜 잠수함 생활 때문에 승무원들에게서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 조종실과 기관실에도 이 냄새가 배어 있다. 디젤 엔진의 기름 냄새와 음식물 그리고 40여명의 승무원 땀냄새가 뒤섞인 냄새다. 한 승무원은 “잠수함 해치를 열면 그 위를 날아가던 갈매기가 냄새를 맡고 기절한다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라며 웃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의 대령은 귀항하면 목욕탕부터 간다. 출항 때 실은 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며칠간 ‘머리 감지 않기 훈련’도 할 정도로 잠수함에서 씻는 건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아껴 쓴다니 아이러니죠”라며 웃었다.
특히 승무원들은 좌표와 데이터에 의존해 물속을 항해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잠수함이 고장 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상황에 대처한 모의훈련을 하다 진짜로 해저 바닥에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모의 시험 때 측정한 수심과 실제 수심이 달라 바닥에 부딪칠 뻔했는데, 해저 20m에서 간신히 급부상해 사고를 막았지요.” 잠수함 함장 출신 최모 대령의 말이다. 이렇다 보니 잠수함 승무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군 관계자는 “출항 후 2~3일 뒤면 대화거리도 다 떨어져 함 내부는 죽은 듯 침묵 속에 빠져든다”며 “답답해서 소리라도 치고 싶어지게 된다”고 했다. 40일이 넘게 잠수할 때는 잠수함 침실에 법당과 교회, 성당까지 만들어진다.
결국 해군의 핵심 전략무기인데도 잠수함 병과는 ‘3D’ 병과에 속한다. 별도의 승선수당이 60만~80만원 지급되지만 지원을 했다가 중도에 병과를 전환하는 경우도 20~30%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김모 소령은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바닷속을 책임지고 있다는 승무원들의 자부심만큼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호두깎퀴의 최근 게시물
호두깎퀴의 최근 게시물
-
[1]저격수를 키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