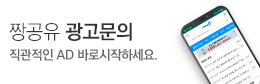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실화괴담] 시선
서울에 살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원에 다니게 되었죠.
학원은 10시에 끝나서 학원 버스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리면
대개 10시 반 즈음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집 앞까지 오면 차를 돌리기 힘들다고 하셔서,
집에서 이삼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내려주곤 하셨죠.
왼쪽 길은 차가 다니는 큰길이고,
가운데 길은 큰길과 똑같은 방향으로 쭉 이어질 뿐인 골목길입니다.
두 길은 끝에 가면 다시 이어지고,
두 길 사이에는 나무가 빽빽해서 서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 두 길 중에서 늘 가운데 길로만 다녔습니다.
당시 큰길에 있는 다리 밑에서
남학생과 그 어머니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때문에 아무래도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시선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통수 부근에 약하게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는 건가 싶어서 돌아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전 다시 돌아서서 가지만 곧 다시 그 느낌이 듭니다.
길이 끝나는 곳까지 계속 그 느낌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도 곧 익숙해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계속 그 길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시 위화감을 느낀 건,
그 느낀 정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 와중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100m 밖에서 보고 있었다면, 오늘은 95m 밖에서 보는 식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느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 뒤통수의 바로 뒤에 얼굴이 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젠 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확실하게 뭔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있을 것 같았기에
저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모른 척 길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다시 그 길로 갔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안일한 생각인지
다시 머리 뒤에 닿을 듯한 시선을 느끼며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미 더는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의 시선을 느끼던 찰나,
갑자기.. 잡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아마 살면서 가장 빨리 달린 것 같습니다.
천식으로 인해 운동하면 금방 천식 발작을 일으켰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언덕을 달려 올라가,
빌라 현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계단을 올라가려면 층계참에 올라서서 몸을 돌려야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돈 순간.
현관 앞에 뭔가 하얀 형상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으아아아아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얘기를 듣고 딱 한 마디만 하셨습니다.
[귀신이란 건 보지 않으려 하면 보이지 않는 거란다.]라고요.
그 뒤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큰길로 다녔지요.
그 두 길 사이에는 나무를 키워서
양쪽이 서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딱 한 군데 중간에 있는 계단을 지날 때면
양쪽이 서로 잘 보여서 그런지 여전히 시선이 느껴졌지만요.
출처: VK's Epitaph
 금산스님의 최근 게시물
금산스님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