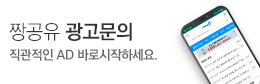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처음 가위 눌리고, 그 후에
짱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팅만 해왔지 글 남기긴 처음이네요.
혼자 자취하면서 적적하기도 하고, 깊어지는 가을 밤 속에, 글 하나 남겨볼까 해서 이렇게 끄적거려 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때는 1997년 IMF시절입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그 시절, 이 1997년도를 기준으로 생선이 반은 줄었을거란 농담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위태위태하다보니 낚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에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이 여파는 저희 집 역시 빗겨가지 않았고 한 집안을 지탱하시던 기둥이셨던 아버지께선 기댈 곳이 없으셨기에..
낚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셨네요. (여담이지만 아직 낚시를 하십니다. 도저히 끊질 못하시더군요.)
바다로 가면 새벽 귀가는 당연시 되던 때이기에 어머니와 누나는 집에 있기로 하고
초등학생이지만 사내아이라고 저만 데리고 갔었네요.
지명은, 잘 모르겠지만 지형은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로 산을 둥글게 달려 불쑥 나온 방파제에(방파제에 차가 들어가진 못하게 막아뒀더군요.) 낚시를 하셨는데
단지 잔잔한 파도만 부서지며 물소리와 짠내음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 사람은 커녕 갈매기 몇 마리만 끼룩거렸는데요.
낚시가 뭔 재미인지도 모르던 저는, 저녁으로 라면 끓여먹을 때 말곤 뒤쪽의 산을 오가며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 6시 즈음 되었습니다.
점점 기승을 부리는 모기와 식곤증의 피곤함에 못이긴 저는 아버지 차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있었네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해는 금방 떨어지려 하늘을 자주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조수석에 앉은 저는 창에 머릴 기대고 노을 속에 낚시 중이신 아버질 보다 눈을 스르르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정수리가 아득해진다는 느낌과 함께,
저의 세상이 온통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길 닿는 곳 마다, 안개가 부풀어 그 안에 새벽을 담은 색이랄까요, 한없이 음울한 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꿈인가..?' 했지만 생각하고 보이는데는 지장이 없었기에
'아, 잠깐 졸았던 사이에 해가 졌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집에 가?'하고 여쭈어보려 눈을 돌리는데..
아버진 방파제에 계셨습니다.
릴을 감으며 낚시줄을 점검하며 앉아계신, 잠들기 전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럼, 내 옆엔 누구지?'
1초......
2초....
3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개를 돌린건 제 머릿속의 이미지일 뿐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도 감고 있었던 것 이지요.
그렇지만 보였던 것 입니다.
귀에는 마치 종영된 방송의 '윙~'하는 이명과 함께.
어떻게? 그럼? 하지만,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람..!? 누구지?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운전석에 어떻게?!
라며 당황하던 저의 시야가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수석 아래의 발.. 오른쪽 사이드 미러.. 제 앞의 와이퍼..
그리고 룸미러.
전 지를 수도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 비춰진 운전석에는 정갈한 가르마를 탄 여성이,
안면의 근육을 이용해 미친 사람의 그것과 비슷한 미소로 거울을 통해 절 보며 웃고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비명을 지르려하고 저항을 시도할 수록
웃는 입 모양 그대로 입을 점점 크게 벌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울.
거울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정수리와 목이 보이다가,
점점 빠른 움직임속에 거울로 비친 것은 광기어린 미소가 걸린 입과 눈빛만을 오가며 보게 되었습니다.
공포에 젖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밤이 되었던 걸로 봐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경기를 일으키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께 뛰어간 저는 추위와는 상관없이 떨리는 몸을 가누며 집에 가자고 매달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때까지 떨고 있던 저에게 '무서운 꿈을 꿔서 그렇다.' 라고 일축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장장 일주일에 거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자든,
부모님과 함께 자든,
불을 켜고, TV를 틀고 잠이 들어도
저의 시야에는 항상 그녀가 저를 보며 예의 그 미소로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쪼그리고 앉아 모아 쥔 다리사이로,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절 보며 웃는 눈빛과 올라간 입매가 절 미치게 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저는 잠들었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5kg가량 살이 빠지게 되는 등 고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열흘이란 시간이 지나고서, 어느 순간 그녀가 사라졌지만
후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가위구나..' 하고 말이죠.
.
.
.
.
.
이 일이 제가 처음 겪었던 경험이고 후에 가끔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가위'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 날은 잠을 못드는 거니까요 ^^;
괜찮다면 다음엔 다른 가위 경험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써본 난잡한 글 읽으시느라 힘들으셨을 짱공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