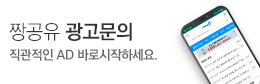최근 방문
굳은살 위에 쓴다
내게 문학은 모험이고 삶이며 오래도록 한길로 이끈 뿌리다.
제살 깎아 먹는 짓을 밤낮으로 하니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들은 늘 걱정이다.
시 쓰고 투고하는 일을 처음부터 즐긴 것은 아니었다.
각종 문예지와 신춘문예에 떨어질 때마다 느낀 좌절은 삶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늘 힘들게 했다.
스물여덟 살 때 고향을 떠났다.
결혼도 안하고 제갈길 간다며 짐 싸들고 도시로 간다고 했을때 아버지는 당신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결혼해서 잘살길 바랐던 아버지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었다.
한달 이라는 시간을 두고 아버지 마음을 돌렸다. 도가 되든 모가 되든 달려 보겠다고.
늦깎이 대학 생활은 철저히 외로웠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에게 논술과 글쓰기를 가르쳤다.
대학에 공부하러 다니는지, 등록금을 벌려고 다니는지 알수 없는 나날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큰 꿈을 이룰 줄 알았던 부모님의 기대도 깡그리 저버렸다.
문학과 삶의 중심에서 이렇다 할 무엇도 내게는 없었다.
용달차에 책만 싣고 내려왔다.
문학과 삶의 밑바닥은 끝이 없는 듯했다.
해서 몇 달 동안 탁발 순례를 했다.
세상 밖에서 방황하는 딸이 돌아와 좋다던 부모님을 남겨 놓고 이틀 만에 절로 들어가 4년간 살았다.
작년 9월, 등단 10년 만에 첫 시집 [벚꽃 문신] 을 냈다.
습작 시절까지 합하면 19년이다.
고 2 때부터 신춘문예에 응모해서 지금까지 참으로 오지게 달려온 시간이다.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문학잡지는 물론이고 시를 응모할수 있는 곳이라면 모조리 투고했다.
떨어지면 그 이유를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정리된 시를 보냈다.
이리저리 뜯어보고 단어를 바꾸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스스로 한 발이라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래저래 나이만 차는 딸년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뭐가 그리 좋은지 시에 20년을 바쳤으니, 3년 전 저승 간 아버지에게 고개조차 들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떨어질 때마다 가슴의 상처에 굳은살이 박였다.
그 굳은살 위에 쓴다.
글로 써서 덧대 준다.
 온리원럽의 최근 게시물
온리원럽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