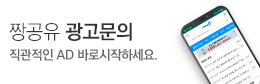어긋난 사랑니의 고통은, 생각보다 더 지독하다.
댓글
1조회
340추천
2
웃는 얼굴로 다시 너의얼굴을 마주할수 있기를.."
하고싶은것도. 원하는것도 많았던 훈련병 시절.
수첩안에 빼곡히 적었던 수많은 소원중에,
그렇게도 원했던 내 마지막 소원이였는데
전역을 한달 남짓 앞둔 지금,
새끼손가락 걸며 꼭 행복하자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취해버린듯한 기분이다.
한시간 전에 먹은 저녁반찬이 뭐였는지,
내가 방금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두달전 술먹고 같이 잔 여자의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기억의 일부를 지우고싶었는데
어느샌가 그어떤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기억이 죽어버렸다.
정말, 그런줄 알았다.
초저녁. 노을이 스며든 내방의 붙박이장 한켠에서, 눈에 익은 조그만 상자를 발견했을때.
희미해진 기억속에서 "이 별사탕 2년동안 다 모아서 줄께"라는 미완성 편지의 한구절을 발견했을때,
그래서 열어본 작은 박스에선 모으다 만 별사탕이 가득할때.
구청앞의 버스정류장. 누군가를 기다리는 소년에게서 문득 몇해전 내모습을 떠올릴때.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징징대는 후임을 달래준다던가,
새로 전입온 신병을 앉혀놓고 "니 여자친구도 조만간.." 이라며
마음대로 말해놓고는 깔깔대는 나를 발견했을때,
오래도록 접속하지 않아 인적이 끊긴 홈피에서 오래전 끄적인 낙서들을 발견했을때,
간혹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이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는 몇번이고 나를 기어코 무너지게 만든다.
어떤것도 기억하지 못할거라고 행각했는데.
이건 내 마지막 글이다.
다시는 펜을 들 자신이 없다.
웃고, 울며 적었던 내 기억의 끄적임들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그만둬야할듯하다.
이제 글을 쓸수가 없다.
니가 없는 빈자리를 글쓰는 일로 채우곤했었는데
이젠 그자리를 채워야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집착이라고 했다,
'첫눈 오는 어느겨울날 우연인듯 다시 만나자' 영화속의 멋진 대사처럼,
영혼이라도 팔아 우연처럼 널 다시 만나고싶었다.
모든게, 미련인듯 지나친 집착이라면... 널 다신 꿈꾸지 않겠다.
나는 사랑이 뭔지 잘 모른다.
그저 나는 너에게 웃었고, 너는 나에게 웃었다.
서로에게 웃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다.
웃는법을 잊어버렸다.
이제 누구에게도 웃어주지 못하는 나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수가 없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다.
다시는, 글을 쓸수도, 누군가를 사랑할수도 없을것같다.
 슈렉언니의 최근 게시물
슈렉언니의 최근 게시물